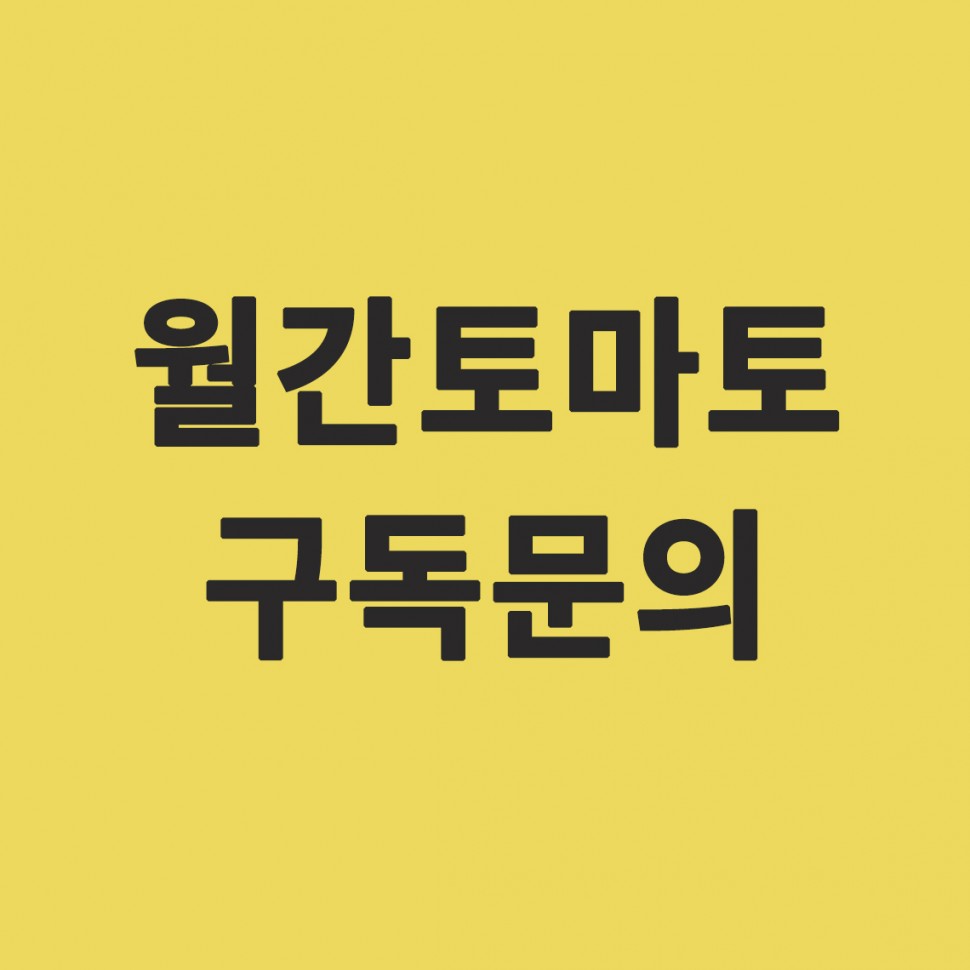-
[6월 98호] 놀이터는 섬이 아니다
‘사랑하는 딸에게: 딸을 위한 놀이터’를 전시 중인 홀스톤 갤러리. 호수돈여자고등학교 학생들이 갤러리 바닥에 앉아 미술 수업을 하고 있다. 조별로 기획서를 만드는지 서로 이야기하는 게 시끌벅적하다. 갤러리를 찾은 손님이 있다는 걸 알아채고 학생들은 자신들끼리 질서를 찾는다. 그리고는 전시 입구까지 낯선 관객을 안내하더니, ‘바닥이 땅으로 꺼진다.’, ‘바닥이 출렁출렁 댄다.’ 하면서 겁을 준다.
손으로 벽을 짚고 합판으로 된 경사면을 따라 다른 세계로 관통할 것만 같은 또 다른 길로 들어선다. 어두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좁은 길, 양손으로 벽을 더듬어 간다. 쿵쿵, 밖에서는 학생들이 벽을 손으로 쳐 가며 소리를 낸다. 까르르 터지는 여고생들의 웃음소리를 들으며 미끄럼틀같이 비탈진 면을 오리걸음으로 지나니 이윽고 낯선 문에 다다른다. 무릎을 꿇고 기어가지 않으면 도저히 지날 수 없는 문이다. 문을 지나자 선물 같은 작은 방이 등장한다. ‘갤러리’라기보다 ‘작은 방’이라는 단어가 더 어울리는 곳. 이곳에서 잠시 헛웃음이 나온다. 이 기이한 체험은 무엇인가, 과연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가 전시란 말인가.
전시 이름은 ‘사랑하는 딸에게: 딸을 위한 놀이터’다. 독립큐레이터 류병학, 조성은 씨가 공동기획한 이 전시의 초대작가는 안상진 작가와 그의 딸 안성민 양이다. 아빠는 딸을 위한 놀이터를 생각했고 딸은 아빠가 만든 놀이터에 자신의 그림을 내어 놓았다.
전시의 초입, 길처럼 이어진 공간의 양쪽 벽에 안성민 양이 어린 시절에 그린 그림이 걸렸다. 방향을 꺾자 나온 또 다른 길에는 안성민 양이 만화로 채운 스케치북 몇 권이 방석 위에 놓였다. 또다시 방향을 꺾으니 이제는 그 만화가 액자 속에 자리했다. 이 길에서부터 전시는 체험이 된다. 양쪽 벽을 손으로 더듬고 때론 오리걸음으로, 때로는 기어서 당도한 방. 그 방에 걸린 그림들은 아이의 것도, 어른의 것도 아니다. 안성민 양의 그림을 안상진 작가가 다시 그렸다. 딸의 스케치 중 한 장면을 선택해 색을 입혀 하나의 다른 그림을 그렸다. 이 그림은 안성민 양의 것도, 안상진 작가의 것도 아닌 모호한 경계에 있다. 대신 그 경계에는 작가의 작은 바람이 담겼다.
“아이가 초등학교 5학년 때 파워포인트 숙제를 봐 주는데 깜짝 놀랐어요. 아이가 영혼 없이 그저 ‘숙제’를 하고 있었던 거죠. 어렸을 때는 그런 애가 아니었는데 얘도 사회적 압박을 피해갈 수 없겠구나 생각했어요. 이런 생각을 표현도 못 하고 마음 한구석에 담고 있었는데 류병학 선생님이 제 얘기를 듣고 그 점에 초점을 맞추게 된 거죠. 때 묻기 전 아이 그림을 카피해서 ‘굳이 어른이 되지 않아도 괜찮아.’ 하고 이야기 건네는 거예요.”
안성민 양은 어려서부터 그림 그리는 걸 좋아했다. 부모님이 모두 작가여서인지 그림 그리는 게 자연스러웠다. 안상진 작가는 웹툰 작가가 되고 싶다는 딸의 꿈이 한편으론 안쓰럽고 한편으론 기특하다. 작가가 딸을 응원하는 방법은 그저 좋은 재료를 사주는 것뿐이다. 잔소리 없이, 필요할 땐 한 번의 조언으로 응원과 격려를 대신한다.
한창 사춘기인 딸은 처음에 전시로 자신을 드러내는 일을 반기지 않았다. 좋은 경험이 될 거라는 아빠의 이야기, 자신을 따로 만나 전시에 관해 설명하는 류병학, 조성은 씨의 이야기에 안성민 양은 자신의 그림을 관객에게 꺼내 보이기로 했다. 그림을 내보이는 공간은 아빠가 딸을 위해 만든 놀이터이며 관객에게 제안하는 놀이터다.
안상진 작가는 그동안 막연하게 ‘놀이터 사장’이 되는 게 꿈이라고 말해 왔다. 그가 말하는 놀이터는 남녀노소 즐겁게 놀고 공부도 하고 책도 읽는 자유로운 공간이다. 그저 막연한 상상이었다. 상상 속 놀이터를 만들려면 야산 하나쯤은 필요했고 이것은 또 돈이 드는 일이었다.
그간 페인팅으로, 여러 공공프로젝트에서 설치로 관객을 만났던 작가는, ‘꿈’과 ‘작업’이 합치될 수 있다는 것을 이번 전시를 하며 깨달았다. 이번 전시는 안상진 작가에게 오랜 시간 했던 작업을 다시 원점으로 돌리는 계기였다.
“기존 작업의 틀을 깨고 미술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선입견을 떨치는 데 1년이 걸렸어요. 1년 동안 몸이 아파서 아무것도 못 했어요. 그 시간 동안 여러 생각을 했고 류 선생님과 대화하면서 제가 지니고 있던 놀이터란 개념을 작업으로 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죠.”
죽음을 넘나드는 상황에서 작가는, 삶에 큰 미련은 없었다. ‘가면 가는 거고, 남겨질 몇은 슬프겠지.’ 하는 생각이었다. 그런데 모든 치료를 마치고 건강을 되찾은 지금, 이상하게도 작가는 전과는 다른 사람이 되었다.
“90학번이라 대학 다닐 때가 민주화 운동의 끝물이었어요. ‘너는 왜 밖으로 안 나가냐.’라는 말도 들었어요. 제 오랜 습성이에요. 투사 쪽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태생 자체가 현실에 안주하지는 못해요. 이번 전시는 저로서는 엄청난 운동이에요. 틀 내에서지만, 어느 정도 기존 체제에서 벗어나 적극적으로 발언한다는 게 제게는 첫 단추고, 씨앗이에요.”
딸의 그림은 일부러 모아둔 것은 아니고 버릴 수가 없어 두었다. 치료가 끝난 시점에, 딸의 그림을 사진으로 기록해 정리하려다 처음으로 자세히 본 딸의 그림이 생각보다 재미있었다. 당시, 놀이터와 관련한 전시 기획은 이미 끝났던 상태였는데 그 기획에 딸의 그림으로 방점을 찍었다. 딸에게 그림 그리는 것은 곧 ‘놀이’였고 종이는 ‘놀이터’였다.
안상진 작가는 전시로 관객에게 놀이란 무엇인가에 관한 질문을 던진다. 눈과 몸이 즐거운 체험을 마련해 두고 커다란 물음표 몇 개를 던지는 것이다. ‘삶에서 즐거움이란 무엇인가.’, ‘일과 놀이는 어떤 경계를 지니는가.’에서부터 시작해 ‘삶과 예술은 하나가 될 수 있는가.’에까지 다양한 생각 거리를 건넨다.

“이 전시 자체가 마네킹이기는 하지만, 예술과 일상의 삶이 가까워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요. 전시가 사람들에게 그런 자극이 됐다면 아주 기쁠 것 같습니다. 놀이터는 섬처럼 존재하는 놀이 공간이 아니라, 가는 곳마다 보이는 거라고 생각해요. 궁극적으로 생활 터 모든 곳이 놀이터예요.”
안상진 작가가 말하는 ‘즐겁게 일하는 법’은 쉽고도 어렵다. 누군가는 알고 싶어도 깨달을 수 없는 경지다.
“지금 하는 일이 내 미래의 자산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 생각을 해 보면 지금 일이 자산인지 소모적인 것인지 알 수 있죠. 저는 사는 게 내 일이라는 걸 30대 중반쯤에 눈치 챘어요. 아마 대부분 사람은 그런 줄도 모르고 살 것 같아요. 저는 꼬맹이한테 필요할 때 한두 번 강하게 얘기하고 공부를 시키지도 않아요. 그보다 사는 게 네 일이라는 걸 알려줘요.”
서울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안상진 작가는 이번 전시를 계기로 홀스톤 갤러리와 인연을 맺었다. 작가는 이 갤러리에서 전시한 것이 큰 보람이었다고 말한다. 무엇보다 즐거워하는 학생들을 보는 것이 큰 기쁨이었다. 또 학생들과 진행한 작가와의 대화 시간에 많은 것을 배웠다. 직설적이고 솔직하고 작품을 ‘바로’ 보는 학생들에게 배운 점도 많았다.
학생들은 이번 전시의 또 다른 주체였다. 빙글빙글 돌아 ‘작은 방’에 가 닿는 과정을 몇 번이고 반복하며 즐거워하고 관객들 또한 그 즐거움으로 안내했다. 그런 학생들이 안상진 작가는 그저 예쁘다.
“딸아이가 꼬리빗을 좋아해요. 가지고 다니면서 자주 빗고요. 그 꼬리빗을 껴둔 스케치북을 전시했는데 시간이 지나도 꼬리 빗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학생들이 재미로라도 가져갈 만한데 말이에요.”
전시를 진행하며 가까이에서 고등학생의 생활을 바라보며 안상진 작가는 입시 교육의 현실에 암담해지기도 했다. 밤 열한 시까지 공부하고 다음날 또 아침 일찌감치 학교에 나오는 학생들을 보며 말이 되지 않는 현실이라고 생각했다.
그 현실 속에서 ‘사랑하는 딸에게: 딸을 위한 놀이터’가 ‘섬’이 되지 않기를, 관객들에게, 학생들에게 ‘놀이’의 즐거움이 일상에서 늘 함께하기를 안상진 작가는 바란다.